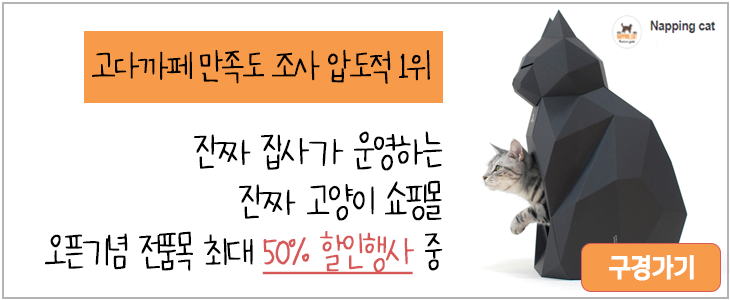-
오토매틱(기계식)시계 입문을 위한 시계 5선about WATCH 2021. 5. 10. 07:44728x90반응형
기계식 시계는 구새대 물건이다?
기계식 시계는 낡은 기술이다. 쿼츠라는 대용품에 비해 무겁고 번거롭다. 비교할 수 없이 비싼데 정확하지조차 않다. 남자의 물건이라면 이것보단 실질적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예물로 산 쿼츠 시계는 두 번쯤 찼다.
시계를 일로 다루기 시작한 후에도 그 생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수백 명의 장인이 몇 년에 걸쳐 개발했다는 수천만 원짜리 기계식 시계가 만 원짜리 쿼츠 시계보다 부정확하다는 역설에 머리 한 구석이 불편했다. 게다가 시계 브랜드들은 시계 앞 면을 뚫어가며 그 복잡하지만 쓸모 없는 메커니즘의 작동을 과시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던 20세기 디자이너들이 무덤에서 한탄할 일 아닌가.
하루는 빈티지 시계 수집가와의 인터뷰가 잡혔다. 전부터 알고 지낸 그 건축가는 모처럼 만나 반갑다며 시계를 하나 선물했다. 내 첫 기계식 시계였다. 기계식 시계의 매력에 대해 묻는 내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태엽이 풀려 죽어 있던 시계를 ‘탁’치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면서 살아나는 데 그게 그렇게 좋아.” 정말로 즐거운 얼굴이었다.

과연 그가 준 시계를 손목에 차고 귀에 가까이 대면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같았다. 요즘 보기 힘든 디자인이라 재미로라도 얼마간 차고 다녔다. 하지만 지독하게 부정확했다. 만든 지 30년은 족히 지났을 그 시계는 두어 시간에 10분쯤 오차가 났는데 웃기는 건 그게 빨랐다 느렸다 일정하지도 않았다.
노상 시계를 손목에 찬 채로 크라운을 돌려 시간을 맞추다 크라운이 빠졌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애초에 크라운은 손목에서 시계를 푼 후 돌리도록 만들어진 부품이다. 애플 워치의 디지털 크라운이 탐탁치 않은 이유다.
헤어나올 수 없는 기계식 시계의 매력
두어 달 시계를 서랍 속에 넣어뒀다 종로에서 약속이 생긴 김에 예지동 시계 골목에 시계를 들고 갔다. ‘수리’라는 글자가 보이는 곳 아무 데나 들어가 시계를 보여주니 아저씨 얼굴이 환해지며 대뜸 시계 뚜껑을 열어 속을 확인한다. 참고로 그 시계는 이베이 중고가가 100달러도 되지 않는 저렴한 물건이었다.
“이거 참 오랜만에 보네. 메커니즘이 엄청 독특한데 말이지.” 이런 얼굴을 전에도 본 적이 있다. 시계의 매력을 말하던 건축가 같은 표정이었다. 아저씨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골목을 뒤져 제 짝인 크라운을 구해주었다. 어쩐지 그때부터 시간 날 때마다 시계를 만지작거렸다.
시계보다 그 표정이 궁금했다. 그러다 숨은 기능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 날짜와 요일을 맞추는 법이었다. 캘린더 워치였지만 크라운으로 분침을 죽어라 돌리는 것 외엔 요일과 날짜를 바꿀 방법이 없어 요일을 맞추는 건 애초에 포기한 터였다. 그런데 크라운을 뒤로 돌려 자정을 넘겼다가 앞으로 10시쯤까지 돌리고, 다시 자정을 넘기니 날짜는 그대로인 상태로 요일이 바뀌는 게 아닌가.
예지동 시계 아저씨가 말한 ‘독특한 메커니즘’의 정체가 이거였구나. 두 시간마다 시간을 새로 맞춰야 하는 이 구닥다리 시계에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애착이 생긴 순간이었다. 그때 나도 건축가와 시계골목 아저씨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겠지. 그 후로 모든 게 달라졌다.
시계공들은 오랜 세월 직면한 수많은 문제를 톱니바퀴와 나사, 스프링만으로 해결해 왔다. 기계식 시계의 째깍이는 소리에 그 역사가 손에 잡힐 듯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남자는 적어도 좋은 시계를 평생 두 번은 살 가능성이 있다. 고만고만한 디지털 기기에 어지간히 물린듯한 그는 기계식 시계에 대한 글을 원했다. 그런데, 그 때가 되서 급하게 시계를 고르려면 그냥 적당히 들어 본 브랜드, 누구나 다 선택하는 모델중에 적당히 선택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아예 기계식 시계를 모르는 이들을 위한 1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계식 시계 다섯 개를 소개한다. 결혼 예물로 해도 좋고, 성공했을 때도 좋다. 아니면 그 순간을 위한 예행 연습으로 입문용으로 선택해도 좋다.
기계식 시계 1 : 스와치 시스템 51

요즘 기계식 시계 업계에서 유행하는 게 이른바 ‘자사 무브먼트’다. 시계를 작동시키는 메커니즘을 브랜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었다는 뜻. 전엔 대부분의 메이커가 무브먼트를 돈 주고 사와서 바늘을 붙이고 케이스만 입혔다.
완벽한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라고 마케터들은 말하겠지만 사실 그 동안 무브먼트를 공급하던 ETA에서 강짜를 놓아서 그렇다. 그 결과 자사 무브먼트랍시고 값은 훨씬 비싸졌지만 품질은 예전만 못한 웃기는 상황도 꽤 생겨나고 있다. ETA의 배후인 스와치도 이 흐름에 동참했다.
51개의 부품을 단 하나의 나사로 고정한 새로운 방식의 기계식 무브먼트를 장착한 ‘시스템 51’이다. 19만 3천원이라는 가격이 마치 다른 브랜드를 비웃는 것 같다.
기계식 시계 2: 로만손 프리미어 아트락스 렉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산 시계 로만손이다. 오랜 세월 구닥다리로 취급 받았지만, 김연아가 등장한 광고와 함께 주목 받고 있다. 매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계 박람회 바젤월드에도 참가하는 중. ‘프리미어 아트렉스 렉스’는 얼핏 고전적인 모양새지만 세부는 꽤 독특하다.
시계 케이스와 다이얼을 둘러싼 베젤, 러그를 연결하는 방식이 재미있다. 제작사에선 ‘거미’를 연상시킨다고 하는데, 왜 굳이 그걸 강조하는지 모르겠다. 59만 5천원. 이 가격 대에 무브먼트 밸런스가 움직이는 걸 감상할 수 있는 시계는 흔치 않다. 내부엔 일본제 미요타 무브먼트가 들어가 있다.
기계식 시계 3: 티쏘 씨스타 1000 오토매틱

티쏘는 재미있는 브랜드다. 모두가 고급화를 부르짖는 시계 업계에서 브랜드 매니저가 “주유소에 갔는데 알바생들이 다 우리 시계 차고 있더라고”라며 껄껄 웃을 수 있는 브랜드는 티쏘가 유일하다.
매출이 워낙 커서 그렇겠지만, 브랜드 이미지를 걱정하지 않을 만큼 제품에 자신이 있다는 뜻도 된다. ‘씨스타 1000’은 티쏘의 첫 다이버 워치다. 이름에 1000이 들어가지만 단위가 미터가 아니라 피트다. 300미터 정도 방수 성능. 그래도 이 정도면 프로페셔널 다이버 워치라고 할만한 수치다. 가격은 91만원.
글자 그대로 300미터 심해에서 찰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언젠가 만난 스쿠버 다이빙 강사에게 기계식 다이버 워치를 차고 잠수해봤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이랬다.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하지.”
기계식시계 4 : 해밀턴 에비에이션 오토 38mm

손목시계는 원래 파일럿을 위한 것이었다. 좁은 콕핏 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확인하기 힘든 파일럿을 위해 만들어진 것. ‘에비에이션 오토 38mm’는 기본에 충실한 파일럿 워치다. 시계와 그 안의 숫자, 시계 바늘까지 큼직큼직 시원스러워 남성적이다.
시계를 만든 해밀턴은 합리적인 가격에 기계식 시계를 내놓고 있는 미국 브랜드다. 100년 이상의 전통도 있고, 흔한 중국제 시계보다 가격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낫다. 92만원. 욕심 부리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다는 면에서 첫 기계식 시계로 가장 먼저 추천할만 하다.
기계식 시계 5: 융한스 막스빌

이 가격대에 정장에 어울리는 기계식 드레스 워치를 찾기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특별한 기능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 가격대엔 브랜드들이 대상 연령대를 워낙 낮게 잡고 단가를 낮춰 시계를 만들기 때문에 질리지 않는 간결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소재, 충실한 마감이라는 조건을 모두 갖춘 시계를 찾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단추를 잠근 셔츠 소매 속으로 쏙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얇아야 하는데, 수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 기계식 시계에서 두께를 줄이는 건 곧 돈이다. 결국 독일 브랜드 융한스의 막스빌 밖에 없었다. 정가는 110만원인데, 작년에 나온 제품이라 90만원 대에 구입할 수 있다. 요즘 유행하는 지름 40mm 이상의 시계와 비교하면 꽤 작은 편인데, 드레스 워치는 애초에 커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위에서 소개한 5개 시계는 시간을 표시하는 것 외엔 이렇다 할 기능이 없고, 소재와 마감도 쿼츠 시계와 비교해 눈에 띄게 나을 것이 없다. 하지만 기계식 시계엔 다른 어디에도 없는 고유한 매력이 있다. 직접 착용하고 만지는 것 외에 그 매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건 손목 위에서 심장이 뛰듯 박동하는 기계식 시계를 통해 몸으로 느끼는 경험이다. 만약 꼭 신품이 아니어도 된다면 대량 생산되어 지금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오메가의 6,70년대 빈티지 시계 역시 고려해 볼만 하다.
728x90반응형'about WATCH'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계 매니아들을 위한 선물 10가지 (0) 2021.06.10 여자에게 선물하면 칭찬받는 시계 5개 골라봤습니다 (0) 2021.06.07 마이크로브랜드 시계는 뭘까? 롤렉스를 따라잡자 (0) 2021.06.03 기계식 시계를 오래쓰기 위해 해야 할 일들 (0) 2021.06.02 쿼츠 시계라고 다 저렴하다는 편견을 버리자 (0) 2021.05.11